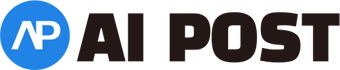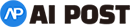충남 태안군 신두리 해안사구에 서자 갑자기 우산이 뒤집혔다. 서해의 비가 비스듬히 내렸고, 바람이 모래풀을 거칠게 흔들었다. 동행했던 한 여행 유튜버는 “한국에서 바람이 가장 센 곳 같다”라고 말했다. 많은 이가 이곳을 ‘한국의 사막’으로 부르지만, 눈앞의 풍경은 다른 사실을 보여줬다. 이곳은 사막이 아니라 파도와 바람, 그리고 식생이 함께 만든 사구였다.
신두리의 모래는 육지에서 출발했다. 금강 하구와 인근 만에서 나온 퇴적물이 연안류를 타고 이동했고, 파도가 그 모래를 해안으로 되밀었다. 겨울 북서풍이 그 모래를 해변 뒤쪽으로 밀어 올려 모래언덕을 만들었다. 비가 많은 기후에서도 사구가 유지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었다.
습기는 통보리사초와 해당화 같은 식생을 키웠고, 뿌리는 모래를 잡아 사구를 더욱 단단히 고정했다. 오늘도 모래는 이동했고, 식물은 그 위에 뿌리를 내렸다. 사구는 느리지만 끊임없이 형태를 바꾸며 살아 있는 지형처럼 호흡했다. 해변 모래를 깊게 파자 물이 스며올랐다.
해안 가까이에서 지하수면이 대체로 해수면과 비슷한 높이에 형성되기 때문이었다. 모래 알갱이 사이의 빈틈으로 바닷물과 빗물이 드나들며 물 표면을 만들고, 우리가 판 구멍이 그 높이 아래로 내려가자 물이 자연히 올라왔다. 밀물과 썰물에 따라 그 수위는 완만하게 오르내렸다. 작은 실험 하나가 사구·갯벌·바다가 같은 수리학적 체계 위에 놓여 있음을 보여줬다.
사구에서 차로 20여 분 이동하자 해식동굴이 나타났다. 어떤 면은 물수리에 닳아 매끈했고, 어떤 면은 결이 살아 있어 손끝에 날카로움이 느껴졌다. 바다는 약한 층과 틈을 집요하게 파고들어 울퉁불퉁한 벽과 부드러운 곡선을 함께 새겨 놓았다. 이곳은 타이밍이 중요했다.
간조와 만조가 접근 가능 시간을 갈랐고, 비 온 뒤 젖은 암반은 미끄러움과 낙석 위험을 키웠다. 두꺼운 밑창의 신발과 충분한 수분·전해질 보충이 장비만큼 필요했다. 탐험은 실내에서 이어졌다. 공룡 화석 발굴 장면을 재현한 디오라마 앞에서 현장 연구의 절차와 섬세함을 확인했다.


한때 ‘알 도둑’으로 알려졌던 오비랍토르는, 같은 지층에서 발견된 알이 실제로는 자기 알이었음이 밝혀지면서 ‘헌신적인 육성자’로 복권됐다. 영화에서 괴수처럼 그려졌던 벨로키랍토르는 실제로는 꿩에 가까운 크기였고, 깃털을 지녔을 가능성이 높다는 최신 연구가 소개됐다.
송진에 갇힌 곤충에서 공룡 DNA를 추출해 되살린다는 이야기는 매력적이지만, 수천만 년 동안 DNA가 안정적으로 보존되기 어렵다는 견해가 그 가능성을 낮췄다. 과학은 이렇게 낭만을 조금 수정하며 앞으로 나아갔다. 신두리의 바람, 모래, 풀 한 포기, 동굴 벽의 결까지, 모든 장면은 연결돼 있었다.


해안 지형은 공급(퇴적물)·운반(파도·바람)·고정(식생)의 균형 위에 서 있었고, 지하수는 그 발 아래서 조용히 오르내렸다. 과학 여행은 결국 ‘보는 법’을 배우는 일이었다. 이름을 정확히 부르고(사막이 아니라 사구), 작동 원리를 떠올리고(물길과 바람길), 위험을 읽어내는 것(조석과 젖은 암반)이 곧 탐험의 기술이었다.
이 취재는 한국관광공사와 ‘여행에 미치다’가 함께한 과학여행 활성화 캠페인 ‘인싸여행’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광고 문구와 상관없이, 신두리의 바람은 충분히 설명적이었다. 바람이 모래를 옮겼고, 식물이 그 모래를 붙들었으며, 바다는 시간의 흔적을 새겨 놓았다. 우리는 그 흔적을 따라 걸었을 뿐이었다.
AI포스트(AIPOST) 이민환 과학커뮤니케이터랩 대표 skddl0514@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