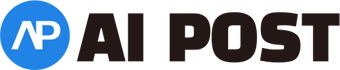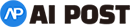국내외 과학현장을 직접 발로 뛰는 필자(과학유튜버 지식인미나니)가 이번엔 연구실이 아닌 야외 과학현장을 다녀왔다. 지구환경시대를 선도하는 국가 통합 생태연구기관 '국립생태원'과의 협업을 통해 실제 환경 연구가 진행되는 현장을 엿보기 위함이다.
국립생태원은 훼손된 환경의 치유를 통해 생물다양성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모델을 창출하는데 앞장서는 기관이다. 쉽게 말해 환경을 지배하는 기본 원리를 다룬다고 볼 수 있다. 이날은 이배근 국립생태원 기획조정실장과 함께 월악산을 올랐다.
연구실이 아닌 산으로 향한 이유는 뭘까. 포유동물을 연구하는 이배근 기획조정실장은 "우리가 산에서 포유류 동물을 관찰하기 어렵다. 흔적을 통해서 봐야 한다. 그 중에서도 가장 오래 남고, 확실한 배설물이나 발자국, 털, 먹은 흔적, 보금자리 등을 찾기 위해 직접 산에 오른다"라고 밝혔다.
천연기념물이자 1급 멸종위기 야생생물인 산양의 흔적을 찾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본격적인 탐사에 앞서 필자는 이배근 실장에 '일부 동물들은 자신의 배설물을 덮어놓는 습성이 있지 않나'라는 질문을 던졌다. 동물마다 차이를 보인다는 게 이 실장의 답변이다.
이 실장은 "예를 들어 너구리는 한 곳에 배설하는 습성이 있다. 일종의 공동 화장실 개념으로 볼 수 있다. 산양도 비슷하다. 배설의 흔적인 '산양 분장'을 발견하면, 산양이 주로 활동하는 곳이라고 보면 된다"라고 말했다. 산양의 흔적은 바위 주위이기 때문에 배설 흔적을 찾다보면 비경이 펼쳐지기도 한단다.
산양의 흔적을 찾아 깊은 산속으로 들어갔다. 다소 험한 곳으로 오르다 보니 고라니의 배설 흔적을 발견할 수 있었다. 보통 배설 흔적을 발견하면 연구진은 사진을 찍고 채집을 한다. 바위 주변에 배설을 하는 산양의 습성을 들었기에, 이 실장과 함께 바위 주변을 주로 살폈다.


그러나 산의 모든 바위를 훑어볼 수는 없지 않은가. 이 실장은 "바닥에 있는 낙엽에 밟은 자국이 없다면 배설물이 없을 확률이 크다"라고 설명했다. 그렇게 산행을 이어가던 중 실제 산양 배설물을 운 좋게 볼 수 있게 됐다. 이 실장의 이야기처럼 한 곳에 배설물이 모아져 있는 형태로 발견됐다.
실제 암벽도 근처에 있었고, 계곡도 펼쳐졌다. 이 실장은 배설물을 통해 '산양이 어떤 풀을 먹고 있는지', '수분을 어느 정도로 섭취했는지', '건강한 상태인지' 등을 분석한 결과를 들려줬다.

이배근 국립생태원 기획조정실장은 "숲은 탄소 흡수원이다. 탄소를 흡수해 주는 게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것이다. 사람들도 자연과 공생하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인간은 생태계에서 벗어나서 살 수 없다. 곰도, 산양도, 다른 동물도 사람도, 모두 공생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목표다"라고 말했다.
좋은 약일수록 인간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에서 자란다는 말이 있다. 대자연 속 어딘가 명약이 숨어 있다는 이야기다. 발길이 닿지 않는 곳에는 약초보다 더 귀한 흔적들이 있다는 것을 이번 취재로 깨닫게 됐다.
AI포스트(AIPOST) 이민환 과학커뮤니케이터랩 대표 skddl0514@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