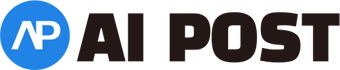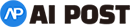과학 유튜버 지식인미나니가 5월 봄의 끝자락에 전라북도 부안군을 다녀왔다. 이 시기에는 어떤 생명체들을 볼 수 있을까하는 취지에서다. 국립생태원 조사팀과 함께 부안군 진서면 운호리에 위치한 운호 저수지를 찾았다. 운호 저수지의 수면은 잔잔했다.
육안으로 보기엔 어떤 생명이 있을지에 대해 가늠하기 어려웠다. 우리가 자세히 보지 않는 곳에서 국립생태원의 조사팀은 생태계의 미세한 징후들을 포착하고 있었다. 그들은 단순한 생물 채집이 아니라, 수질과 생물 다양성, 그리고 생태계의 구조적 건강성을 진단하기 위해 현장을 뛰고 있었다.
“여기, 보세요. 이 작은 물달팽이와 새뱅이들. 겉으론 보이지 않아도 이 안에 다양한 생명이 살아 있습니다” 연구원이 꺼낸 족대 안에서는 정말 다양한 생명이 살아 있었다. 큰 물고기는 잡히지 않았다. 조사팀은 뜨거운 날씨에도 작업을 이어갔다. 과학적 사명감을 가진 연구진들의 모습을 엿볼 수 있었다.
그들의 목표는 많고 큰 것이 아니라 ‘지표가 되는 생명’에 집중하고 있었다. 첫 번째로 모습을 드러낸 것은 피라미(Zacco platypus). 한국에서 가장 흔한 민물고기지만, 이 소형 어류는 환경학자들에게 중요한 수질 지표종이다. 연구에 따르면 피라미는 생물학적 산소 요구량(BOD)이 5mg/L 이하, 용존산소(DO) 5mg/L 이상 수준의 수질에서 잘 서식한다.
이는 곧 피라미의 분포가 하천의 오염 정도를 간접적으로 나타낼 수 있다는 뜻이다. 연구원은 “물고기는 스트레스를 쉽게 받아요. 맨손으로 오래 잡고 있으면 화상을 입기도 합니다. 최대한 빠르게 동정하고 방류해야 하죠”라고 설명했다. 현장 연구원들은 채집 후 수초 안에 피라미를 동정해 다시 물속에 돌려보냈다. 채집의 목적은 포획이 아니라 기록과 이해였기 때문이다.
계곡 바위 틈에 붙은 작은 구조물들은 얼핏 보기에 돌멩이 같았다. 하지만 그 안에는 날도래목(Trichoptera)의 유충이 있었다. 이 곤충은 모래와 식물 파편으로 집을 지어 보호막을 형성하며 살아간다. 유속이 빠른 하천에서도 떨어지지 않게 진화한 구조다.

연구원은 “안쪽을 보면 유충이 움직입니다. 입으로 실을 뽑아 주변 물질을 붙이는 방식이에요. 수질 오염에 민감한 편이라 환경지표로도 쓰입니다”라고 설명했다. 날도래 유충은 하천 생태계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이들은 유기물을 분해하고 다른 생물들의 먹이가 되며, 물리적 구조물로서도 미세 서식지를 형성한다. 한마디로, 보이지 않는 하천 엔지니어인 셈이다.
이번 조사에서는 우리가 ‘붕어’라 부르는 익숙한 어류도 관찰됐다. 그러나 흥미롭게도 연구자들은 이를 ‘참붕어’라 불렀다. 한국 식당에서 흔히 쓰이는 ‘참붕어 매운탕’의 재료는 사실 대개 양식 붕어(Cyprinus carpio)이며, 여기서 발견된 참붕어(Carassius auratus)는 전혀 다른 토종 어류다.
“식당에선 이름을 멋지게 보이려 ‘참붕어’라 표기하지만, 사실 진짜 ‘참붕어’는 이 친구입니다. 붕어와는 생김새도, 생태도 다르죠.” 이 작은 언어의 혼동은 때론 자연을 향한 이해를 흐리게 한다. 이름은 이름일 뿐, 과학은 정확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관찰된 생물은 밤에 활동하는 동작, 일명 빠가사리였다. 이 물고기는 다소 위협적인 특징을 지녔다. 가슴과 등지느러미에는 작은 독샘이 있는 가시가 있어, 사람 손에 찔릴 경우 통증을 유발한다. 실제로 현장에서는 뼈를 ‘꽉꽉’ 부딪히는 듯한 특이한 진동 소리가 들렸다. 일종의 물리적 방어 음향이다.
연구진은 “건드리면 핸드폰 진동처럼 떨리는 느낌이 들죠? 그게 얘네의 위협 반응이에요”라고 말했다. 빠가사리는 한국 민물 생태계의 대표 야행성 어종으로, 주로 밤에 활동하며 저서성 무척추동물을 포식한다. 생태적 지위 또한 중요한데, 식재료로도 많이 사용되는 이 물고기는 민물 생물망의 중간 포식자 역할을 한다.

이날 조사에서 여러 생물들을 마주할 수 있었다. 그들은 계곡의 건강, 물 환경의 질, 그리고 인간과 자연의 관계를 말없이 보여주는 존재라는 점을 다시금 깨달았다. 국립생태원은 매년 전국의 하천과 습지를 대상으로 이 같은 조사를 반복한다.
이들이 수집한 데이터는 환경보전 정책의 기초가 되며, 기후변화 대응 전략 수립에도 기여한다. 생물 다양성은 곧 회복력이며, 회복력은 생존의 다른 이름이다. 생물들이 눈에 잘 띄지 않아도 우리 주변에 함께 있다는 점을 인지하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AI포스트(AIPOST) 이민환 과학커뮤니케이터랩 대표 skddl0514@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