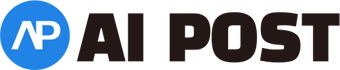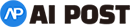지난해 국내 고급 인공지능(AI) 인재 유출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고급 인력 유출을 막고 인재 유입을 촉진할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 지속성장이니셔티브(SGI)는 17일 발표한 '한국의 고급 인력 해외 유출 현상의 경제적 영향과 대응 방안' 보고서에서 "지난해 기준 국내 인구 1만명당 AI 인재 순유출은 -0.36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35위에 그쳤다"라고 밝혔다.
OECD 국가 중 상위권은 룩셈부르크(+8.92명), 독일(+2.13명), 미국(+1.07명) 등이다. 또 2019년 12만 5000명이던 해외 유출 전문인력은 2021년에 12만 9000명으로 4000명 증가했지만, 같은 기간 국내 유입 외국인은 4만 7000명에서 4만 5000명으로 감소했다.
이에 따라 국내 인력의 해외 유출과 외국인 인력 유입 간의 차이도 2019년 7만 8000명에서 2021년 8만 4000명으로 확대됐다. 국내 과학자의 해외 이직률(2.85%)이 외국 과학자의 국내 유입률(2.64%)보다 0.21%포인트 높아 한국은 순유출국에 해당했다.

SGI는 "국내 과학 학술 연구자의 유입과 유출 비중 차이(-0.21%포인트)는 독일(+0.35%포인트), 중국(+0.24%포인트), 미국(0%포인트), 일본(-0.14%포인트) 등 주요국과 비교해도 뒤처진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SGI는 인재 유출의 원인으로 단기 실적 중심의 평가 체계, 연공서열식 보상 시스템, 부족한 연구 인프라, 국제협력 기회의 부족 등을 꼽았다. SGI는 "상위 성과자일수록 해외 이주 비중이 높아 '유능할수록 떠나는 구조'가 굳어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국내 대졸자의 평생 공교육비는 약 2억 1483만원이며, 이들이 해외에서 경제활동을 할 경우 발생하는 세수 손실은 1인당 약 3억 4067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SGI는 밝혔다.
SGI는 성과 중심의 보상 체계로의 전환을 강조하고 이를 위해 성과연동형 급여체계 강화, 주 52시간제 예외 등 유연 근로제도 도입, 연구 성과에 따른 차등 보상 강화가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AI포스트(AIPOST) 유진 기자 aipostkorea@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