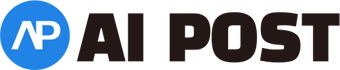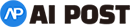영화 '박물관이 살아있다'는 박물관에 전시된 사람들과 동물들이 깨어난다는 소재로 세계적 흥행에 성공했다. 거대한 스케일과 동화다운 상상력이 관객의 마음을 사로잡았기 때문이다.
영화처럼 박제 동물들이 움직이진 않지만, 관람객과 대화를 할 수 있는 기술이 도입된 박물관이 최근 등장했다. 영국 케임브리지대 박물관은 15일(현지시간)부터 관람객들에게 독특한 경험을 제공하기 위한 인공지능(AI) 기술을 도입했다고 발표했다.
박물관 측은 박제 동물이나 멸종 동물과 대화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잭 애시비 박물관 부관장은 "생성형 AI를 이용해 다양한 동물 표본을 되살려 생명력을 불어넣었다"라고 했다. 관람객은 박제된 도도새, 고래, 판다 등을 포함한 13개의 표본에 질문을 할 수 있다.


전시물 옆에 마련된 QR 코드를 스캔하면 모바일에 채팅 상자가 열린다. 여기서 음성 또는 텍스트를 통해 동물과 대화할 수 있다. 잭 애시비 부관장은 "박물관에서 새로운 기술을 시험해볼 수 있는 기회"라며 "20개 이상의 언어로 소통이 가능하다"라고 설명했다.
박물관은 관람객과의 대화에서 얻은 데이터를 분석해 기술을 보완해 나갈 방침이다. 해당 기술을 개발한 AI 기업 네이처 퍼스펙티브의 공동 창립자인 갈 자니르는 "AI를 사용해 비인간적인 관점을 시뮬레이션함으로써, 관객이 자연 세계와 소통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제공한다"라고 말했다.
AI가 답변을 조작하거나 '환각' 현상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네이처 퍼스펙티브는 생태학 전문가팀에서 선택한 엄선된 과학 데이터 세트에 따라 '미세 조정'했다. 갈 자니르는 "가장 마법 같은 측면 중 하나는 연령에 맞춰 적응한다는 것"이라며 "모든 연령대의 방문객이 표본에게 원하는 것을 무엇이든 물어볼 수 있게 된다"라고 강조했다.

동물들이 대화 상대의 나이에 맞게 어조와 언어를 조절한다는 의미다. 동물들은 스페인어, 일본어를 포함한 20개 이상의 언어를 구사할 수 있다. 박물관 측은 한 달 동안 해당 기술을 테스트할 계획이다.
크리스 샌드브룩 케임브리지대 교수는 "AI는 사람들을 비인간적 생명체와 연결하는 흥미로운 새로운 기회를 열어주고 있지만, 그 영향은 주의 깊게 연구돼야 한다"라고 말했다.
AI포스트(AIPOST) 조형주 기자 aipostkorea@naver.com